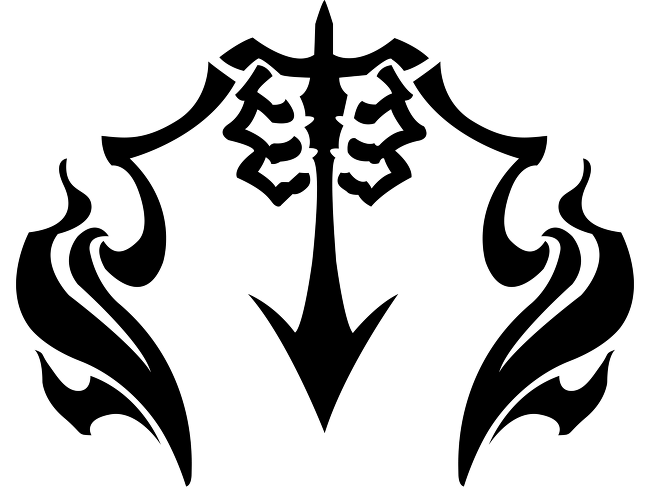01
미하엘은 사자전역에 관련된 사료를 읽던 중, 당시대에 나타났다는 마수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스케치라고 표현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단출한 실루엣의 그림이 어쩐지 눈을 사로잡았다. 독을 품은 숨을 한 번 내쉬면 생물을 시체로 만들고, 반나절 만에 제도를 죽음으로 물들였다는 검은 용은 그 자신도 시체마냥 뼈대만 있었다.
왜 하필 이런 형태를 하게 되었을까? 원래는 이 생물도 따뜻한 살과 피를 갖고 있던 게 아닐까? 제 숨에서 독기로 인해 자신마저 곯아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러고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움직였던 걸까.
“헛소리네.”
열변을 펼치는 미하엘에게 동료가 퉁명스레 대꾸했다.
“사료도 찾기 힘든 그런 전설 같은 걸 연구하겠다고? 도력혁명의 시대에 소설이라도 쓸 셈이야? 이봐, 차라리 경제학 같은 걸 연구하지 그래. 우리 새 후원자는 실용성 있는 분야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어딘가에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전설 속에 남은 생물의 희소한 모습에 호기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 정도 말이 트였다 싶은 사람이면 매번 용의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모두 마지못해 웃거나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미하엘을 핀잔할 뿐이었다.
그래서 미하엘은 용의 그림 따위는 그만두고 얌전히 시키는 대로 경제학을 전공으로 삼아 연구에 매진했다. 앞서 자신을 몽상가라고 무시하던 사람을 연구 성과로 압도하는 것은 제법 재미있었다.
비록 가장 관심 있던 분야에 매진하지 못했더라도, 결국 서른의 나이에 제국학술원의 조교수라는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꽤나 어깨 펴고 다닐만한 인생이었다.
작년까지는, 그랬다.